
고성능 배터리인 하이니켈 배터리의 수명 저하를 유발하는 구조 붕괴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원자 기둥’ 삽입 기술이 개발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에너지저장연구센터 박정진 선임연구원 연구팀이 배터리 수명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하이니켈 양극소재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배터리 연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 니켈 함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니켈 함량이 90%를 넘어서는 하이니켈 양극재는 충·방전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내부 구조가 팽창하거나 급격히 수축하며 무너지는 ‘구조 붕괴 현상’이 발생해 수명이 빠르게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 구조적 불안정성은 배터리 내부에 미세 균열을 발생시키고, 결국 배터리 수명을 급격히 단축시켜 고성능 전기차 보급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연구팀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터리 초기 구동 과정에서 전기화학 반응을 정밀하게 제어해 원자 배열을 재구성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내부 층과 층 사이를 지탱하는 ‘원자 기둥’을 형성해 구조 붕괴를 막는 방식이다. 배터리를 처음 충전할 때 발생하는 전기화학 반응을 활용해 내부 원자들이 스스로 층 사이에 자리 잡도록 유도함으로

NXP 반도체가 하드웨어 기반의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EIS,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을 내장한 배터리 관리 칩셋을 발표했다. 이번 신제품은 전기차(EV)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의 안전성, 수명, 성능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설계됐다. 새로운 EIS 칩셋은 모든 구성요소에서 나노초(ns) 수준의 정밀 동기화를 제공하며, 배터리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해 OEM 제조사가 충전 안전성과 수명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에 발표된 솔루션은 세 가지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유닛으로 구성돼 있다. ▲BMA7418 셀 감지 장치 ▲BMA6402 게이트웨이 ▲BMA8420 배터리 정션 박스 컨트롤러로, 추가 부품이나 복잡한 재설계 없이 EIS 측정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하드웨어 내장형 이산 푸리에 변환(DFT) 기능이 포함돼 있어 정밀한 주파수 응답 분석이 가능하며 실시간 고주파 모니터링을 통해 배터리 상태를 즉각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 기존의 소프트웨어 기반 배터리 모니터링은 밀리초 단위의 동적 이벤트 감지에 한계가 있었지만 NXP의 하드웨어 통합형 EIS 시스템은 고장의 초기 징후를

전기차나 스마트폰 배터리를 반복해 고속 충전하면 수명이 줄어드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국내 연구진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배터리 음극 소재를 개발했다. UNIST 에너지화학공학과 강석주 교수, 고려대학교 곽상규 교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안석훈 박사 공동연구팀은 흑연과 유기소재를 결합해 고속 충전 조건에서도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하이브리드 음극 소재를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 과정은 리튬이온이 전자와 함께 음극 소재 안에 저장되는 과정이다. 그러나 고속 충전 시 리튬이온이 음극 내부로 충분히 들어가지 못하고 표면에 금속 리튬 형태로 쌓이는 ‘데드 리튬(dead lithium)’이 형성된다. 데드 리튬은 재사용되지 못해 배터리 용량을 줄이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다. 연구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흑연 입자(MCMB)와 곡면 나노그래핀(Cl-cHBC)을 1:1 비율로 혼합한 구조를 설계했다. 곡면 나노그래핀은 활처럼 비틀린 구조로 층간 간격이 넓고 나노 크기의 빈 공간이 많아 리튬이온이 빠르게 드나들 수 있다. 이 덕분에 리튬이온은 먼저 곡면 나노그래핀에 저장된 뒤 흑연으로 이동하는 ‘순차 삽입’ 과정을 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가 업계 최고 수준의 감도를 제공하는 새로운 평면 내(in-plane) 홀 효과(Hall-effect) 스위치 ‘TMAG5134’를 출시했다. 이번 제품은 기존 자기저항 센서를 대체할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이고 설계 친화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TMAG5134는 통합 자속 집속기(magnetic flux concentrator)를 내장해 문과 창문 센서, 개인용 전자기기, 가전제품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1mT 수준의 약한 자기장도 감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더 작은 자석을 사용할 수 있어 시스템 차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평면 내 감지 능력을 통해 PCB와 평행하거나 수평한 방향의 자기장을 인식할 수 있어 설계 유연성이 높다. 기존에 엔지니어들은 높은 감도를 확보하기 위해 리드 스위치, TMR(터널 자기저항), AMR(이방성 자기저항), GMR(거대 자기저항) 센서를 활용해 왔다. 그러나 이들 기술은 특수 소재와 복잡한 공정을 필요로 해 비용 부담이 컸다. TI는 TMAG5134를 통해 설계 비용과 출시 기간을 줄이는 동시에 기존 홀 효과 센서보다 우수한 감도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 제품은 평균 소비 전류가 0.6µA에

KAIST와 LG에너지솔루션 공동연구팀이 리튬메탈전지의 난제였던 덴드라이트 문제를 해결하며 전기차 배터리 기술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번 성과는 리튬이온전지가 제공하던 600km 주행거리 한계를 넘어, 12분 충전으로 800km 주행을 가능케 하는 차세대 배터리 상용화에 청신호를 켰다. KAIST 생명화학공학과 김희탁 교수와 LG에너지솔루션이 함께 운영하는 프론티어 연구소(FRL) 연구팀은 ‘응집 억제형 신규 액체 전해액’ 원천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리튬메탈전지는 흑연 음극을 리튬메탈로 대체한 차세대 전지로, 높은 에너지밀도를 자랑하지만 충전 시 발생하는 덴드라이트 문제로 안정성과 수명이 제한됐다. 덴드라이트는 나뭇가지 모양의 리튬 결정체로, 전극 내부 단락을 유발해 급속 충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공동연구팀은 덴드라이트 발생 원인이 리튬메탈 표면에서의 불균일한 계면 응집반응임을 규명하고, 이를 억제하는 새로운 액체 전해액을 제시했다. 이 전해액은 리튬 이온과의 결합력이 낮은 음이온 구조를 활용해 계면 불균일성을 최소화하고, 급속 충전 상황에서도 덴드라이트 성장을 효과적으로 막는 특징을 보였다. 그 결과, 전지는 1회 충전 시 800km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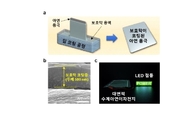
헬로티 서재창 기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차세대 이차전지인 수계아연 이차전지의 배터리 수명 저하 문제를 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ESS는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내보내는 장치다. 밤이나 바람이 없는 날 등 태양광과 풍력이 전기를 생산할 수 없을 때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신재생에너지 기술에 필수적인 설비다. 최근 리튬이온 이차전지 기반 ESS 장치에서 잇따라 불이 나면서 물을 전해질로 사용해 폭발 위험이 없는 수계아연 이차전지가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아연 금속을 음극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물 기반 전해질 속에서 부식이 일어나게 되고, 아연 이온이 음극 표면에 나뭇가지 형태의 결정체로 쌓이기 쉽다는 문제가 있다. 이 결정체가 분리막을 뚫고 양극에 맞닿을 경우 단락을 일으켜 수명을 단축하게 된다. 생기원 제주본부 김찬훈 박사 연구팀은 아연 음극 표면의 화학적 성질에 따라 결정체 형성이 억제되고 형태도 달라지는 것을 전자현미경을 통해 최초로 관찰해냈다. 아연 음극 표면이 물 분자와 쉽게 결합하는 친수성 상태일수록 배터리를 충전할 때 아연 이온이 음극 표면에 더 균일하게 흡착돼 결정체 형성이 억제된다는 사실을 밝혀냈

배터리 수명이 모바일 기기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다. 소비자들은 점점 강력한 모바일 기기를 요구하지만, 배터리 수명 때문에 이를 맞춰주기 어려울 때가 많다. 성능이 강해지면 배터리 소모량도 늘게 마련이다. 성능만 강하고 배터리 수명이 짧은 모바일 기기는 소비자들에게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다. 배터리 딜레마를 호소하는 엔지니어들이 많은 이유다. 이런 가운데 아날로그 혼합 신호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맥심 인터그레이티드 코리아가 배터리 수명을 효과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낮은 대기 전류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하는 자료를 공개했다. 관련 내용을 정리했다. 중대 전환점 맞은 배터리 수명 최신 웨어러블,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작동시키는 것은 무엇일까? 체온 측정, 인슐린 투입, 심박수 모니터링을 위한 의료용 패치는 긴 시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이 기기들은 사용되기 전까지 오랜 기간 비품실과 의약품 창고에 보관되지만 의사와 환자는 배터리가 잘 작동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찬가지로 스마트워치, 이어폰, 비디오 게임 컨트롤러는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위해 충전 후 장시간 작동해야 한다. 전기 계량기, 가스 탐지기, 빌딩 자동화 시스템 등 현장에서 쓰이는 수

▲ 애플 맥북 프로 [사진=애플] [헬로티] 미국 소비자 전문지 컨슈머리포트(Consumer Reports)가 배터리 수명문제로 권장등급을 받지 못한 맥북 프로에 대한 재실험을 진행한다고 10일(현지시각) 전했다. 작년 12월 맥북 프로에 대한 실험을 한 컨슈머리포트는 ‘맥북 프로 배터리 수명이 권장수준에 못 미친다’며 권장 등급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에 애플은 “컨슈머리포트 실험과정에 있어서 인터넷 브라우저 캐시를 끈 것이 배터리 수명에 문제를 일으켰다”며, “관련 버그를 수정했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컨슈머리포트는 수정된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은 후 배터리 테스트를 재진행할 예정이며 테스트 결과에 따라 권장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지환 기자 (ueghqwe@hell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