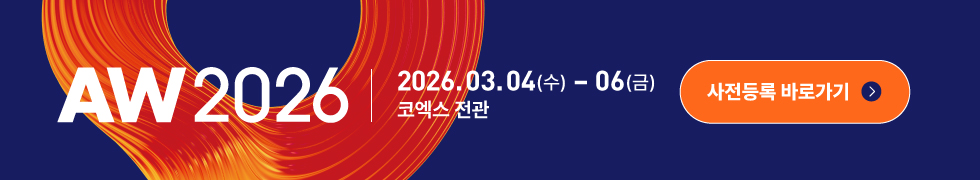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의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BYD는 내년에 양산할 신차에 엔비디아의 차세대 차량용 반도체 '드라이브 토르'(DRIVE Thor)를 탑재할 계획이다. 이 반도체는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결합한 시스템온칩(SoC)으로, 최대 2천 테라플롭스(TFLOPS)급 연산 성능을 보유했다. 1테라플롭스는 1초당 1조 차례의 연산을 처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BYD에 앞서 중국 샤오미가 지난 3월 출시한 전기 세단 'SU7'에도 엔비디아 자율주행 칩 '오린'(Orin)이 탑재됐다. 중국 지리자동차의 고급 전기차 브랜드 지커가 내놓은 신차 '믹스'에도 같은 엔비디아 반도체가 장착됐다. 이처럼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가 엔비디아 반도체를 사용하려는 이유는 자국 소비자들의 차량 구매 성향과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MZ 세대'처럼 중국에서 '링링허우'(2000년 이후 출생자)로 불리는 중국 젊은 층이 차량 구매 시 자율주행 기능과 대형 디스플레이 탑재 등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엔비디아의 고성능 자율주행 반도체는 주로 대만 TSMC를 통해 양산이 이뤄지고 있다. TSMC는 엔비디아 주문에 따라 양산한 비메모리 반도체에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를 붙여 패키징하는 형태로 완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의 니즈에 따라 엔비디아 제품을 사용하려는 유인이 강하지만, 정작 미국과 그 우방인 한국, 대만을 거치지 않고서는 전기차용 고성능 반도체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오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 이후 중국으로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길이 더 좁아지거나 막힐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중국 반도체·전기차 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견제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반해 한국과 일본은 독자적 차량용 반도체 기술력 확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미국 출신 반도체 엔지니어 짐 켈러가 최고경영자(CEO)로 있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스타트업 텐스토렌트와 제휴를 맺었다. 현대차그룹은 고성능 반도체 개발한 필요한 설계자산(IP)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5000만 달러(약 680억 원)의 전략적 투자도 단행했다.
일본도 지난 3월 도요타와 닛산 등 완성차 업체의 차량용 반도체 연구개발에 10억 엔(약 9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들 기업이 개발한 반도체 양산은 일본 민관 합작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가 맡을 전망이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