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창업한 넷플릭스는 전 세계적으로 동영상 스트리밍 비즈니스에 필요한 인터넷 인프라와 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바이스 보급이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폐쇄적으로 고착화된 수직 통합적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존의 미디어 기업들이 어떻게 스마트미디어 기업으로 변화해야 하는지 도전을 받게 되며 향후 스마트미디어 비즈니스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들어가면서
올해 1월 7일, 스마트미디어의 대명사인 넷플릭스(Netflix)가 한국에 진출했다. 초기 우편 기반의 DVD 대여 서비스에서 시작해 2010년 유료의 OTT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로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한 넷플릭스(Small 2012: 42)는 단계적인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으로 진출 중이다.
이 글의 목적은 현재 단순 멤버십 가입만으로 클라우드상에서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동영상 콘텐츠를 꺼내 시청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이룬 넷플릭스(Netflix)의 비즈니스 모델 특성들을 탐색하는 것이다.
인터넷 유통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1997년 캘리포니아의 스콧밸리(Scotts Valley)에서 리드해스팅스(Reed Hastings)와 막랜돌프(Marc Randolph)에 의해 설립된 넷플릭스는 오프라인 유통 기반의 DVD 판매와 대여를 인터넷 유통 기반으로 전이시킨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이루었다.
이 기업은 1998년 4월 14일, 30명의 직원으로 925개의 DVD 타이틀을 배달해주는 동네 비디오 대여점 수준에서 시작했지만, 우편 시스템을 활용했다. 당시 관련 업계에서는 넷플릭스의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이해하지 못했고, 우편 발송 방식의 DVD 배송 서비스를 고객이 찾지 않을 것이라고 비아냥댔다.
몇 년의 수난기를 거쳐 넷플릭스는 1999년 도시바의 한 영상 콘텐츠 담당자를 설득했고, 이후 휴렛팩커드, 애플과도 손을 잡게 되고, 이를 지켜보던 소니가 먼저 손을 내밀게 된다. 이후, 넷플릭스는 우편 봉투를 개선해 특허를 받는다. 특허를 받은 우편 봉투는 기존 봉투보다 좀 더 길게 디자인됐는데, 이 디자인은 DVD를 안전하게 담을 수 있게 했고, 우편 요금 상승을 막기 위해 보다 가볍게 제작했으며, 견고하여 DVD 파손율을 1% 이하로 하락시키는 데 기여한다.
그외에도 우편 봉투의 라벨이 수취인의 주소를 보여주어 언제든지 이용자는 DVD를 넷플릭스로 반송할 수 있으며 영화 사진이 봉투에 프린트되어 개인화가 모색되기도 한다.
이러한 배달 시스템의 단순화와 유통센터의 확산으로 넷플릭스는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Wilson & Crawford, 2012). 넷플릭스는 2009년 8월 58개 유통센터를 세운다(Borrelli 2009).
자동 추천 시스템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넷플릭스는 1998년에 DVD 구매 제공을 중단하고 1999년 월정료 기반 비즈니스 모델로 일원화했고, 2000년에 가입자들의 영화 평론에 의거해 자동으로 선호할 영화를 추천해 주는 영화 추천 시스템을 만든다.
이를 토대로 2002년, 넷플릭스는 월정료 수익의 20%를 가져가는 50여개 영화사들과 계약을 체결하고(Funding Universe 2012), 영화 추천 시스템 성공과 계약 수 증가로 힘을 받아 급기야 2002년 5월 22일 나스닥에 ‘NFLX’ 티커심볼(Ticker Symbol: 증권을 주식 호가 시스템에 표시할 때 사용하는 약어)로 5백5십만달러를 한 주당 15달러에 출자했다. 당시 회원 수는 60만명이었다.
점차 그 증가세가 빨라져, 같은 해 말에는 회원 수 86만명으로 전년대비 88%가, 2003년에는 회원 수 150만명으로 전년대비 74%가, 그리고 2004년에는 회원 수 261만명으로 전년 대비 76%나 증가하는 가입자 성장세를 보인다. 이후 DVD 플레이어의 빠른 보급으로 당시 미국 내 총 가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가 DVD 플레이어를 보유했고 이것이 넷플릭스의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토대가 된다.
넷플릭스의 ‘시네매치’라는 영화 추천 시스템은 이용자들의 이용 패턴을 비교해 관심사의 유사성을 찾아내 유사한 이용 패턴을 가진 사람들에게 관련 영화를 추천해주는데, 가입자 시청 이력 데이터를 분석해 자동으로 가입자가 좋아할 만한 영화를 추천해 주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를 위해 넷플릭스는 수학, 컴퓨터 공학, 인공지능, 엔지니어링 기술 기반으로 가입자의 DVD 클릭 패턴, 검색어, 대여 목록, 평점을 분석해 회원 개개인의 취향을 알아내, 회원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를 자동으로 추천해주고, 운영자는 이를 지역, 부사, 명사 장르, 기반, 배경, 제작자, 영화의 내용, 타깃 연령대의 조합으로 로직화했다.
또한 넷플리스는 알고리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100만달러(약 11억원)의 상금을 걸고 ‘넷플릭스 프라이즈’를 개최하여 한층 더 정교한 데이터 분석 기법을 선보이는 계기가 됐다(Thompson 2008). 3년 동안 186개국의 약 4만 팀이 참여했는데, 2009년에 우승한 Bellkor’s Pragmatic Chaos팀의 알고리즘은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문서만 92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다(Netflix 2012, https://signup.netflix.com/MediaCenter/Press).
실시간 스트리밍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넷플릭스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서 2007년 1월 16일이 가장 중요한 시기로 거론되는데, 바로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가 채택된 날이다. 개인 PC에서 이용 가능한 인스턴트 스트리밍 서비스(Instant Streaming Service)를 시작으로 회원 수 750만명을 기록했는데, 전년대비 15% 성장세로 2007년 당시 넷플릭스 가입자들은 월정료를 내고 1천여 편의 영화와 TV 시리즈를 개인 PC로 시청할 수 있게 된다(Netflix 2012, https://signup.netflix.com/MediaCenter/Press).
넷플릭스는 7.99달러 월정료에 무제한 영화와 TV 시리즈를 시청하게 했는데, 스트리밍은 이용 네트워크 대역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거의 즉시 시청하는 방식이라 다운로드 방식과 차별하였으며, 광고도 제공하지 않는다.
이후 모방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넷플릭스는 더 이상 동영상 스트리밍 시장을 주도하는 유일한 기업이 아니기 시작한다(Isaac 2011). 아마존은 ‘아마존 인스탄트 비디오(Amazon Instant Video)’를 ‘아마존 프라임(Amazon Premium)’ 회원 대상으로, 10만 편 영화와 TV 쇼를 제공하며, NBC 유니버설, 뉴스코프(News Corporation), 디즈니의 연합체인 훌루(Hulu)도 무료 동영상 스트리밍에 이어 월 7.99달러 ‘훌루플러스(Hulu Plus)’를 출시했고, 오프라인 유통사인 월마트(Wal-Mart)도 스트리밍 기업인 부두(Vudu)를 인수했다.
그 외에도 2012년 파산 직전의 블록버스터를 인수한 미국 위성 TV인 디시 네트워크(Dish Network)는 ‘디시월드(Dish World)’ IPTV 서비스로 탈바꿈해, 가입자들은 블록버스터에서 디시월드 IPTV인 200여개 채널 프로그램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으며, 페이 퍼 뷰(Pay Per View)나 SVOD 기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2012년 대형마트에서 DVD 자판기를 통해 DVD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 레드박스(Redbox)를 인수한 버라이존도 2013년에 레드박스를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로 탈바꿈시겼다.
글로벌 시장 현지화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넷플릭스는 기술 및 디자인 외에 목표 고객을 해외로 더욱 확대해간다. 특히 스트리밍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넷플릭스는 미국 3천만 가입자 확보를 계기로 글로벌 진출을 계획하고, 2010년 그 첫 번째 국가로 동일 언어권인 캐나다를 선택한다.
그 이후부터 2011년 9월 6일부터는 43개의 캐리비안 및 남미 국가들에 진입해, 브라질에서부터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 멕시코로 확대했으며(Associated Press, 2011), 특히 멕시코에서는 텔레비자(Televisa), 티비아즈테카(TV Azteca)를 제공한다(Sosa, 2011).
이듬해인 2012년 1월부터 유럽으로 진출, 영국(월 5.99파운드)을 시작으로 아일랜드(월 6.99유로),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스웨덴, 덴마크 등으로 확장하고, 서유럽인 벨기에, 독일, 프랑스로 계속해서 진출한다.
또한 2015년에는 호주, 뉴질랜드, 일본으로 진출하는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진출을 본격화한다. 넷플릭스는 진출 대상국에서의 콘텐츠 편성을 위해 해당 국가 이용자들의 선호 콘텐츠를 해적 사이트 데이터 분석으로 확인하여 이를 제공해 가입자를 확보해나가게 된다. 예로 네덜란드 진출 시에는 토렌트 트래픽 분석으로 ‘프리즌 브레이크’ 등 인기 콘텐츠 리스트를 확보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특히 독일 이용자 수는 넷플릭스 진출(2014년 9월) 이후 급증해 1년 만에 두 배인 420만 규모로 성장했고, 호주에서도 출시(2015년 4월) 3개월 만에 300만을 확보하게 된다(박현수/민준홍 2015).
최근 사례로 2015년 9월 2일 아시아태평양 최초로 일본 시장에 진출한 넷플릭스는 1개월 무료 이용 기간을 내세우며 9월 2일부터 마케팅 제휴한 소프트뱅크(Softbank) 홈페이지, 판매점, 콜센터, 가전매장을 통해 가입 가능하게 했으며, 요금은 소프트뱅크 청구서에 통합 청구 가능하게 한다. 넷플릭스는 화질과 시청 가능한 디바이스에 따라, 650~1,450엔의 3가지 요금제를 출시한다. 650엔 요금제는 SD 화질에 시청 가능한 디바이스가 1개로 제한되는 최저가이고, 월 950엔 요금제는 HD 화질에 디바이스 2개, 월 1,450엔의 프리미엄 요금제는 UHD 화질에 4개까지 시청 가능하다.
일본 진출 전략의 핵심은 가격에 민감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요금과 현지인에 맞는 콘텐츠 구성이다. 또한, 넷플릭스의 현지 콘텐츠 비중은 보통 10~20%이지만, 일본에서는 이를 40%로 확대할 방침을 발표한다(Bloomberg, 2015). 이는 일본의 유료 TV 월정료가 미국만큼 높지 않으며, 시청자들이 지상파 방송이 제공하는 무료 콘텐츠 중심으로 콘텐츠를 소비하고 해외 콘텐츠 수요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실제로 2011년에 일본에 먼저 진출한 훌루가 일본에서 고전한 주요 이유도 현지 콘텐츠 부재로 꼽히고 있다(FierceOnlineVideo 2015).

멀티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넷플릭스는 동영상 스트리밍의 글로벌 진출을 2010년부터 시작했는데, 그 이전인 2008년부터 게임 콘솔인 Xbox360, 플레이스테이션3나 블루레이 플레이어, TV 셋톱박스 업체들과 함께 제휴하여 넷플릭스 제공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각 회사의 기기들을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넷플릭스는 앱 서비스의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공개해 다양한 플랫폼들에 탑재되어 유통 단말 및 플랫폼 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무엇보다도 출시 시점을 단축하게 된다.
그 결과로 넷플릭스는 2008년에 회원 940만 명을 조기 달성해 전년대비 26% 증가를 경험한다.
2011년 조사에 의하면, 넷플릭스를 개인 PC로 시청하는 사람은 42%, 닌텐도위로 이용하는 사람은 25%, 컴퓨터를 TV에 연결해 시청하는 사람은 14%, 플레이스테이션3를 이용하는 사람은 13%, Xbox360을 이용하는 사람은 12%로 집계됐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디바이스 플랫폼들에 서비스를 멀티호밍(Multihoming)시킴으로써 넷플릭스는 거의 모든 스트리밍 디바이스 플랫폼에 탑재되는 멀티플랫폼 기업이 된다. 특히 넷플릭스는 모바일 단말 외에 인터넷에 접속된 TV 디바이스, 즉 커넥티드 TV에 관심이 많다. 2010년 구글이 구글 TV(2011년 안드로이드 TV로 API 개방)를, 삼성전자가 삼성스마트 TV를 출시하면서 커넥티드 TV가 본격화되는데 운영 시스템(Operating system; 이후 OS) 파편화로 OS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대표 OS로는 안드로이드 TV, 로쿠(Roku), 웹 OS, 파이어폭스 OS, 타이젠(Tizen), 오페라(Opera) 등이 있다(Renesse 2015.6). 비용, 편의성 측면에서 스트리밍 디바이스 중 셋탑박스와 동글이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주도하고 있으며, 로쿠와 구글, 아마존이 대표적인데, 이 박스들에서 모두 제공되는 스트리밍 서비스는 넷플릭스 외에 훌루플러스, HBO GO, 유튜브, 워치 ESPN, PBSKids 등이 있다.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외에는 판도라 같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도 필수로 자리 잡고 있다(Gunnarsson 2015.6.26). 넷플릭스는 셋탑박스인 로쿠를 시작으로 게임 콘솔인 닌텐도의 위(Wii) 플랫폼들, 소니의 PS3, MS의 XBox360, 블루레이 플레이어들(소니, 파나소닉, 필립스 등), 인터넷 접속 HDTV들(삼성전자, LG전자 등), 홈 극장 시스템(파나소닉, LG전자, 삼성전자, 인시그니아 등), 스마트폰, 태블릿 PC(아마존 킨들파이어 플랫폼들, 삼성전자 등), DVR(티보 등) 등 거의 모든 단말에 탑재되어 있다.
킬러 콘텐츠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넷플릭스 비용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용은 단연 콘텐츠 방영권이다. 넷플릭스는 영화 추천 알고리즘 개선을 위해 외부 공모를 실시한 바 있는데, 콘텐츠 관련해서는 고객 데이터 분석을 통해 TV 시리즈 기획을 해 자체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다. 요금제 변경 시도와 콘텐츠 가격 상승 요구가 맞물리면서 영업 이익 적자를 맞이하면서 자체 콘텐츠 제작을 고려한 넷플릭스는 킬러 콘텐츠 확보 전략을 취하게 된다.
넷플릭스는 자사 가입자에게 인기 있는 콘텐츠와 피드백 수를 감안하여 콘텐츠 대체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한 뒤 콘텐츠 공급자에게서 콘텐츠를 구입했을 때의 효용과 이와 유사한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제작했을 때의 효용을 상호 비교하여 자체 제작이 비용 대비 효용 측면에서 유리함을 확인했고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활용한다.
자사 고객 동영상 시청 선호도를 분석한 넷플릭스는 예컨대 이용자들이 1990년대 BBC의 미스터리 드라마를 선호한다는 것과 BBC에서 제작한 드라마를 좋아하는 경우 케빈 스페이시(Kevin Spacey)가 주연한 드라마나 데이비드 핀처(David Fincher) 감독이 제작한 드라마를 직접 찾아서 본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박현수/민준홍 2015.11).
이를 토대로 2011년, 케빈 스페이시 주연,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리메이크작인 ‘하우스오브카즈(House of Cards)가 제작된다(Kafka 2011). 13개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시즌 2편 제작에 1억달러를 투자하여 2013년 2월 1일 시즌 1이 방영된다.
또한 2006년에 폭스가 이미 취소한 시트콤 ‘어레스티드 디벨롭먼트(Arrested Development)’가 리메이크되어 첫 번째 오리지널 코미디인 ‘릴리하머(Lilyhammer)가 2012년 2월 6일 스트리밍되는 등 넷플릭스의 자체 제작 비중은 초기 5%에서 시작하여 점차 확대되어, 2015년 450시간 분량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이 예상됐었다(정윤미 2015.9).
한편, 글로벌 진출 중인 넷플릭스는 현지의 킬러 콘텐츠 직접 제작도 병행한다. 프랑스에서는 현지어 오리지널 드라마 시리즈인 ‘마르세이유(Marseille)’를 제작해 독점 제공하고, 영국에서는 엘리자베스(Elizabeth) 2세 여왕을 주제로 한 ‘더크라운(The Crown)’을 자체 제작했고, 노르웨이, 콜롬비아 등지에서도 현지 킬러 콘텐츠 제작을 추진 중이다.
2015년 9월 진출한 일본에서도 넷플릭스는 현지 킬러 콘텐츠 제공을 위해 현지 업체들과의 협력에 주력한다. 2015년 6월 지상파 방송사인 후지티비(Fuji TV)와 공동 제작 제휴를 맺어, 공동 제작으로 13부작 드라마인 ‘언더웨어(Underwear)’와 2012~2014년에 방영된 리얼리티쇼로 18부작 리메이크인 ‘테라스 하우스(Terrace House)가 있고, 연예 기획사인 요시모토흥업(Yoshimoto Kogyo)에 제작비를 지원하고 일정 기간 독점 방영권을 갖는 협약도 체결했다(Market Realist, 2015).
또한 2016년 초 진출한 한국에서의 현지 킬러 콘텐츠 확보를 위해 넷플릭스는 먼저 영화에 투자해, 봉준호 감독의 신작 ‘옥자’에 5천만달러(약 577억 원)를 투자한다. ‘옥자’ 제작사인 옥자SPC와 브래드 피트가 이끄는 할리우드 중견 제작사인 플랜B엔터테인먼트가 공동 제작한다. ‘설국열차’에 나왔던 틸다 스윈턴을 비롯해 제이크 질런홀, 폴 다노, 켈리 맥도널드, 빌 나이 등이 출연하며, 2017년 개봉 예정이다. 이전에도 넷플릭스는 영화 ‘와호장룡2,’ ‘워 머신,’ ‘비스트오브노우네이션’ 등에 투자했다(조선닷컴 2015.11.11).
나가면서
본고는 넷플릭스의 비즈니스 모델 특성들을 구분하여 열거했다. 요약하면, 1997년 창업한 넷플릭스는 인터넷 유통 시장의 리더 기업을 시작으로 추천 알고리즘 개발, 글로벌 가입자 확대, 핵심 서비스의 자산화에 주력했다. 결론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동영상 스트리밍 비즈니스에 필요한 인터넷 인프라와 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바이스 보급이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스마트미디어 기업이 된 넷플릭스는 그 동안 폐쇄적으로 고착화된 수직 통합적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존의 미디어 기업들이 어떻게 스마트미디어 기업으로 변화해야 하는지 도전을 받게 되며 향후 스마트미디어 비즈니스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예로 폐쇄적인 미디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일본의 미디어 기업들은 2015년 넷플릭스와 아마존의 진입으로 큰 도전을 받는다. 이미 초고속 인터넷망이 잘 구축되어 있고 지하철, 카페 등에 와이파이 설치가 보편화되는 등 유무선 인터넷 인프라 환경이 매우 양호한 일본에서는 2013년 기준 유무선 브로드밴드 보급률이 모두 50%를 돌파했고, LTE와 3G를 합한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1억3천만명을 돌파했으며, 2014년 기준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등 무선 인터넷 인프라가 양호하지만, 당시 일본 OTT 전체 가입자 수는 700만 명 정도로, 3,600만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대비 SVOD 보급률은 20% 정도이다(FierceOnline 2015.8).
일본에서는 지상파 방송 콘텐츠 선호도가 매우 높으며, 유료 방송 보급률도 30% 미만이다(Financial Times 2015.9). 넷플릭스가 진입하기 전 일본 OTT 비디오 시장 주체는 기존 기업과 제3자 기업으로 대별되는데, 기존 기업으로 NTT도코모(Docomo), KDDI, 소프트뱅크 통신 3사가 2013년 구글 크롬캐스트 같은 동글을 출시했고, 소프트뱅크는 2014년 말 ‘BBTV넥스트’라는 자체 스트리밍 서비스를 출시했다.
또한 NHK, 후지TV, TV아사히(Asahi), NTV 등 주요 방송사들은 자체 OTT 비디오 서비스를 각자 제공 중이며, NTV는 훌루일본(Hulu Japan)을 운영 중이다. 제3자 기업으로는 니코니코(Niconico)와 유넥스트(U-Next)가 있다. 넷플릭스가 진입하기 전 일본 내 SVOD 경쟁 구도는 ‘dTV’, ‘훌루일본’, ‘유넥스트’ 간 3파전이다.
NTT도코모의 dTV는 2014년 11월 출시해 월정액 500엔으로 2015년 7월 500만 가입자를 확보했고, 훌루일본은 2011년 9월 출시해 월정액 980엔 단일 요금제로 100만 가입자를 확보했으며, 유넥스트는 2009년 2월 출시해 월 1,990엔(SVOD 990엔+1,000엔 PPV)에 8만 편 콘텐츠를 제공 중이었다. 여기에 넷플릭스와 아마존이 가세한 것이다.
넷플릭스와 아마존의 갑작스런 SVOD 시장 진입에 일본 현지 기업들의 대응이 시작됐다.
먼저, 각각 제공하는 데에서 벗어나려는 후지TV, TV아사히, NTV, TV도쿄(Tokyo), TBS 등 5대 방송사들이 준비 중인 연합체 중심 SVOD ‘티브이어(TVer)’는 채널당 10개 프로그램으로 편성되며 광고 없는 무료 서비스가 될 예정이며, 30개 콘텐츠 공급자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출시할 보노보(Bonobo)는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등 PPV 서비스이다.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했으며[R0190-15-2027, 고신뢰 사물지능 생태계 창출을 위한 TII(Trusted Information Infrastructure) S/W 프레임워크 개발], 2016년 1월 [방송통신연구] 논문지에 학술논문으로 게재됐으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기고문을 작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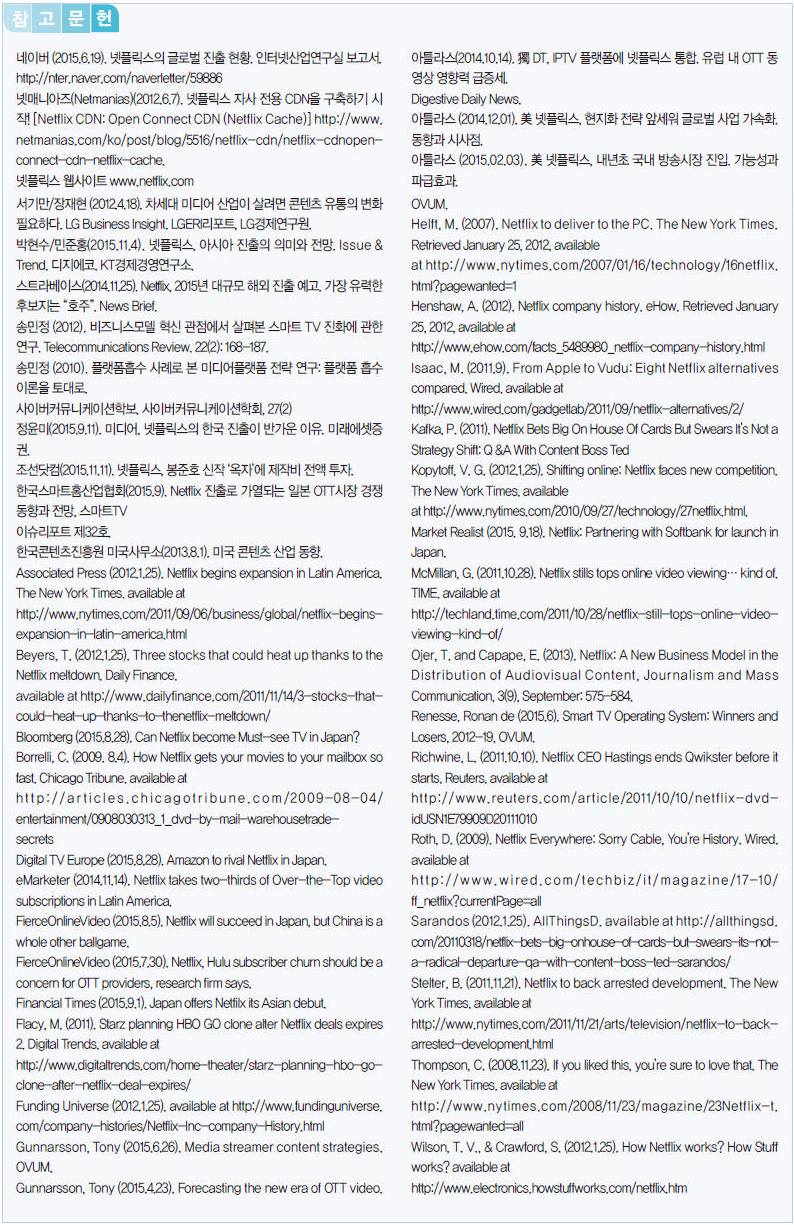
송민정 _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신문방송학과 교수
Copyright ⓒ 첨단 & Hellot.net
